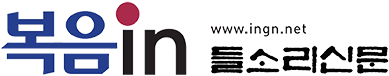바푸(Bapu=father) 함석헌의 삶

1980년 1월 YWCA 위장결혼식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함석헌. ⓒ들소리신문
고생 전혀 모르면서도 약하고 가난한 이들 아픔, 눈물 공유
'바닥 사람'들을 향해 마르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비 바푸 함석헌은 타고난 바닥사람이었다. 도대체 높일 줄을 몰랐고, 앞설 줄을 몰랐다. 1등이란 말은 아예 그 삶의 사전엔 존재하지 않았다. 아랫놈! 그것은 하늘이 지어준 함석헌의 본명(사진/本名)이었다. 이상스러우리만큼 함석헌은 아랫것들, 바닥 것들을 생각했다. 그가 타고난 바닥 놈, 아랫놈이었으니….
바푸 함석헌은 타고난 바닥사람이었다. 도대체 높일 줄을 몰랐고, 앞설 줄을 몰랐다. 1등이란 말은 아예 그 삶의 사전엔 존재하지 않았다. 아랫놈! 그것은 하늘이 지어준 함석헌의 본명(사진/本名)이었다. 이상스러우리만큼 함석헌은 아랫것들, 바닥 것들을 생각했다. 그가 타고난 바닥 놈, 아랫놈이었으니….
가슴 속에 하늘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본가는 결코 빈가가 아니었다. 아버지 함형택은 고명의 한의였다. 인근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부터 만주까지 환자들이 몰려들어 어머니는 환자들 뒷시중에 쉴 겨를이 없었다. 동네에 기와집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함석헌의 집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큰일을 해내시기도 했다. 많은 땅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참하기 그지없는 석헌은 집안에서 뿐 아니라 온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일곱 살 나이에 `천자'와 `언역'을 집에서 다 읽었고, 여덟 살엔 삼천제(三遷齊) 서당에 다니며 명심보감(明心寶鑑)을 뗐다. 아홉 살이 되면서 삼천제서당이 변해 덕일(德一) 소학교가 되는데, 덕일학교를 거쳐 1914년엔 양시공립보통학교에, 그리고 1916년 4월 평양 고등보통학교(平壤高等)에 진학하게 된다. 부자집 아들로서의 성장이었다. 가난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태생부터 무관한 석헌이었다. 그렇게 자라는 석헌에게 주위에서까지도 기이히 여기는 것이 `하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었다. 아이 석헌의 하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가히 지극(至極)한 것이었다.
함석헌이 덕일소학교를 졸업하려 할 무렵이었다. 같은 반에 정말 가난한 동무가 있었다. 석헌은 그 동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기는 중학교에 갈 건데 그 동무는 못 갈 것이란 예감 때문이었다. 석헌은 그 애 아버지가 저도 중학교에 가겠다며 보내달라는 말에 `얘, 온 장터에 두루 다녀도 쌀 사자는 놈은 있어도 글 사자는 놈은 없더라'며 호통 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였다.
'나는 중학교에 가는데 내 동무는 못 간다니….' 석헌은 꼭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그 호통에 그만 눌려 말도 못하고 시무룩해버리는 친구를 보며 미안해 무슨 말을 해주어야겠다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어쩔 줄을 모르게 했다.
그 동무는 그 후 아버지를 따라 농사꾼이 되었다. 학교엘 갔다가 방학에 돌아오면 그 얼굴과 손이 점점 농사꾼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다. 함석헌은 후에 그 동무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농사꾼이 되어가는 그의 손을 좀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고, 천연히 서로 얘기는 하면서도 혹 뽐낸다 할 듯 해서 두렵던 생각에 될수록 공부얘기나 내가 가 있는 도회지의 이야기는 피하려 했던 생각이 지금도 있다”고.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다. 석헌이 여나문 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동리에 학순이라는 이가 있었다. 학순이란 고기잡이를 해서 살아가는 이었는데 욕 잘하고, 게으르고, 게다가 가난하기로까지 동네에서 유명했다. 그 아내 역시 다르지 않았다. 늘 허리에서 한발이나 빠지게 시커멓게 때가 낀 베옷을 주르르 끌고 다니고 욕 잘하기로 소문이 나있어 마을에 점잖다는 이들은 거의가 외면하는 그런 이였다.
어린 아이들도 그 집을 부를 때는 학순네, 학순네 했다. 거의 사람 대접을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 학순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석헌이보다는 세 살 아래에 한 학년 밑이었다. 어느날 석헌이와 학순네 아들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 되어 마을에서 5리 길쯤 떨어진 정거장까지 아침 일찍 선생님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찌 돼 그랬던지 다른 이들은 다들 먼저 돌아갔는데 학순이 아들과 석헌이 둘이만 뒤떨어지게 되었다. 얘가 걷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사연을 물은즉 배가 고파 못가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늦잠을 자느라 아침을 못먹고 선생님 전송을 나왔더니 배가 고파서 걸을 수가 없노라는 것이었다. 석헌은 학순이 아들을 업고 가기로 했다. 학순이 아들은 나이에 비해 예상외로 몸집이 큰애였다. 그래도 업기로 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마을에 다 왔을 때는 이미 석양이었다. 석헌은 그 애를 그 애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석헌은 무척 기뻤다. 학순이네! 마을의 어린애들까지도 특별히 무시하거나 멸시해서가 아닌, 그저 어른들이 부르는 대로 학순이네, 학순이네로 호칭하는 천덕꾸러기 자식을 아이 석헌은 제 등에 업은 것이었다. 석헌이 가슴 속에 하늘이 있었다. 그것이 신비라는 것이다.
고생이란 티끌만큼도 모르고 커온 아이, 그저 곱게, 귀하게(?), 연하게만 자라온 아이, 어떻게 그 같은 아이 가슴 속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앓는 공감(共感)이 있었을까? 그래서 함석헌을 일러 `타고난 씨알, 타고난 바닥살이'이라고 공언(公言)하는 것이다.
함석헌의 '바닥 것들'에 대한 사랑
“열넷, 열다섯이 되어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노라고 물아랫 소년이 보따리를 걸머지고 그 장씨네, 김씨네의 `고래 같은 기와집' 근처를 지나노라면 그들과 우리와는 딴 세상을 사는 것 같았고, 그래도 그 기와집 옆에 무너져가는 `막서리'에 살며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들이 새파란 `안댁', `나리님'들한테 이랬나, 저랬나 하는 반말질을 수굿수굿 듣는 것을 볼 땐 가엾기가 한이 없었다. 사실 같은 물아랫 사람끼리 사는 우리 사점엔 그런 꼴은 없었다. 누가 누구를 하대하는 일은 없었다. 바닥에서 무슨 차별이 또 있을까? 바닥이 꼭대기지”.
“그런 이야기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랫방 작은 놈'이다. 아랫방이란 것은 가난해 서당지기 노릇하며 아랫방에 살았기 때문이요, 크도록 이름이 없어 작은 놈으로 불렸다. 집이 가난하여 두부장수로 겨우 풀칠을 해가고 아들 둘이 다 서른이 넘어 마흔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고 머리를 땋아뜨린 채 턱에는 시커멓게 수염이 났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라도 가라 하면 “어머니를 버리고 남의 집살이를 어찌하느냐?”며 호미로 문지방을 긁으며 울고 평생 날마다 바다 강변을 돌아 밀물에 떠들어 온 어떤 것들을 주어다 먹을지언정 언제 남의 집에 빌러가는 법이 없는데 형제가 다 그렇지만 작은 놈이 더욱 그러했다.
못생겼다고 아이들이 들러붙어 놀려주면 “얘, 이거 싸움이냐 갈갬이냐? 싸움이면 그만두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보통 말로하면 못나서 그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가 “아들 있으면 뭐 해요, 아들 두고도 망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 백성이 아닐까? 하늘 백성이 땅에 오면 그렇게 뵈지 않을까? 못났거나 잘났거나 나는 오늘 그리운 것이 “얘, 싸움이면 그만 두자” 하는 사람이다. 작은 놈은 이제 어찌됐을까? 살았다면 여든이 됐을 것이다(1964. 3. 1). 공산당도 아마 작은 놈은 해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작은 놈이 큰 놈이지.”
함석헌의 가슴엔 적어도 된 놈과 안 된 놈, 작은 놈과 큰 놈, 버릴 놈과 취할 놈이 따로 없었다. 함석헌의 가슴엔 안 된 놈과 된 놈이, 작은 놈과 큰 놈이, 버린 놈과 버려진 놈이 전혀 다름(隔意)없이 하나로 존재한다. 죄와 거룩이 신비스럽게 공존한다. 그래서 바닥을 향해 마르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함석헌을 어떤 반론에도 개의치 않고 바푸(Bapu=Father)라 부르는 이유이다.
바닥살이들을 향해 흐르는 함석헌의 사랑, 함석헌의 바닥살이들을 향한 사랑의 극치는 그 바닥살이들에게 `이름'을 주고, 역사의 주체로 받쳐 올렸다는 데 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한 시기를 짓는 사건”이라면서, 그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함석헌은 이렇게 변증한다. “이제부터는 씨알”의 역사다. 자주(自主)하는 민(民)의 역사다. 그 전에도 혁명도 있고 반항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귀족계급이 하는 것이었고 군인이 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민중이 자각해서 하려는 것이다. 그 전에도 민족이 있었고, 그 운동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3·1운동:자주하는 민의 운동-필자 주) 사상적인 운동이다. 민족 자결이라는 주의 아래 되는 운동이었다. 전에는 쿠데타 식의 정변으로 하려 했다. 이것은 민의 평화적인(스스로 하는) 반항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 날치기식의 폭력주의로 정권을 얻으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민중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 민중을 대접하지 않는 자는 민중의 적이요, 민중을 적으로 삼는 자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사고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말 없다고 민중을 업신여기지 말라. 민(民)을 주(主)로 모시고 절하고 호소하라. 하나님은 말 없는 민중에게 그 명(命)을 내리시는 것이요, 하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민중은 말이 없는 것이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