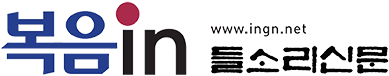상놈·민중·씨알

故 함석헌 선생의 1957년경 생전의 모습(천안 씨알농장 시절). ⓒ들소리신문
지배계급에 의해 규정되고 추방된 `상놈' 끌어안은 함옹
상놈 → 민중 → 씨 은 역사적 그리스도-섬겨야 할 대상
함석헌 안에서는 상놈·민중·씨알이란 말이 아주 은혜스럽게 용해된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것은 용해라기 보다는 용어의 진화라 해야 옳을 것이다. 상놈·상것이라는 말이 옛사람에게는 물론 민(民)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까지도 얼마나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인가? 그런데 함석헌은 이 상놈(상것)을 예찬한다. 그는 그가 난 평안도의 평(評)에서 전해오는 `평안도 상놈'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한다.
“…옛날에도 높은 자리에 앉은 임금이란 공연히 죽은 호랑이 가죽이지 사실 산 임금은 민중이었다. 그래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것 아닌가? 평안도가 호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급없는 민중의 땅이기 때문이었다. 그 용기도 민중인데서 나온 것이다. 무늬 없는, 글 없는 민중이기 때문에 날쌔고 힘이 있는 것이다. 무지무식하기 때문에 왈칵하는 것이지 적은 지혜 지식의 분별을 한다면 힘이 못 나온다. 그것은 힘은 하나되는 데서만 나오는데 알아가지고는 하나는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양반(兩班)으론 안된다 한다. 양반이란 나누어진 것이요, 갈리진 것이라 새 역사에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중은 잃을 것이 없고 대적이 없으므로 근심이 없다. 천하에 무서운 것은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다. 유교에서는 지(智), 인(仁), 용(勇)을 천하에 뚫린 덕(天下之達德)이라 하지만 그것은 곧 민중의 덕, 민중의 속알, 성격이란 말이다. 민중이고서야 인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용할 수 있다.”
상놈 예찬
“상놈이란 상민(常民)이란 말인데 常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떳떳이라니, 상놈은 떳떳한 사람이다. 언제나 있는 사람, 바닥사람, 밑사람, 뿌리사람, 변함없는 사람, 뻐젓한 사람, 하늘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民이 아니고는 하늘을 바로 볼 수 없다. 民은 이른바 天民이라 하늘백성, 낸대로 있는 백성, 하늘밖에 쓴 것이 없고 땅밖에 디딘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감투를 썼다는 것은 곧 물(物)질을 썼다 함이요,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밟고 섰다 함이다. 그러므로 하늘 무서워 가리우는 감투요, 땅이 두려워서 덮는 의자다. 상(常)은 그런 것 다 없다. 그러므로 떳떳(常)이다. 천지가 있는한 상놈이 있을 것이다.”
상놈을 만든 것은 `지배계급의 역사(?)'에 의해서였다. 그 지배계급에 의해서 규정된 상놈은 역사에서 추방된 것들이었다. 하늘이 버렸고 땅이 버린 것들이었다. 함석헌은 그렇게 버려진 것들을 불러모아 역사의 중심으로 안내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사 이래 이같은 경사(慶事)가 언제 또 있었던가?
함석헌의 `상놈 예찬'은 계속된다. “평안도는 잘해서 그랬든지 못해 그랬든지 그 하늘백성, 맨사람의 자리를 받은, 사람대로 있는 사람인데 무엇하자고 푸른산 버리고 마을의 똥개 찾아 내려오는 범 모양으로 저자(a market)에 `해먹자' 무리와 붙어다니나? 평안도가 시비를 듣는 것은 한마디로 상놈되기를 면해보려 하는 것 때문이다. 상놈되기를 왜 버리려나? 상(常)을 떠나려나? 상(常)을 버리면 비상(非常)한 것 같은가?
〈非常〉은 곧 무상(無常)임을 모르나? 덧이 없는 것이다. 민중의 힘을 지니려면 언제나 `상놈'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평안도에 나고 상놈으로 난 것만은 자랑이다. 이 무서운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빠져나가는 것은 역사의 찌꺼기인 특권계급일 것이요, 미래를 차지하는 역사의 상속자는 호랑이의 넋을 가진 민중만일 것이다. 소금의 값이 짠맛을 내는데 있다면 상놈의 뜻은 민중정신을 지키고 길러내고 펼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청산맹호(상놈·민중)가 똥개(소위 양반이라는 자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백두산이 무너진다해도 이 보다 더 설고 분치 않을 것이다. 상놈들아, 너희 몸에 소금을 치고 너희 속에서 더러워진 때를 씻어버려라! 그래야 너희 역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함석헌은 상놈들에게 `바푸'로 어필한다.

함 선생이 영성생활 하던 강원도 고성군 간석면 소천리 안반덕 씨알농장 통나무집(1965년). ⓒ들소리신문
“민중의 힘을 얻으려면 언제 어느때도 `상놈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함석헌이 `상놈'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민중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상놈 예찬은 민중의 예찬이다. 그는 민(民)을 주(主)라 주창한다. 소위 민주(民主)라는 것이다. 물론 민, 민중을 역사의 주체라 주창한 것은 함석헌만 아니다. 상당수의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회학자들, 이상적인 정치가들, 정치학자들이 민중을 말했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 역사를 말했다. 그러나 정치한다는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운동가들, 학자들까지도 민중을 자신들이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알았고, 더구나 자신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서는 그 민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反逆)의 죄를 머뭇거림없이 범했다.
민중을 짓밟고도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당당해야 했다. 그것은 국가도 종교도 다름이 없었다. 돈·땅·사람·권력 같은 것을 더욱 확장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족했다. 그래서 처절하리만큼 상놈은 무시를 당해야만 한 것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달랐다. 함석헌에게 있어 상놈→민중→씨알은 역사적 그리스도였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상놈→민중→씨알은 전심을 다해 섬겨야 할 대상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같이 민(民)을 사랑한 것이다.
함석헌의 민에 대한 사랑은 엄마의 젖먹이에 대한 사랑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혹은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이면서 내 것인 그런 사랑이었다. 상놈→민중→씨알을 위해 거져주고 다 내어주는 사랑, 함석헌의 상놈·민중·씨알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
함석헌의 상놈·민중·씨알의 체화(體化)
상놈→민중→씨알로의 역사를 사는 자로서 함석헌을 바푸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민중 체화(民衆體化)의 일생 때문이다. 이제 오는 역사(to come history)는 상놈의 역사→민중의 역사→씨알의 역사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해온 이들의 이율배반적 모순이 바로 그 씨알의 자리와 내 자리, 그 씨알의 삶과 내 삶을 따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상놈이 민중이요 씨알이 역사의 주체라는 절대 진리의 구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모순의 시대에 우리는 함석헌을 가진 것이다. `바푸'를 가진 것이다. 상놈의, 민중의, 씨알의 체화를 이룬 사람 말이다. 그는 상놈으로 온 것을 자랑하고(“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상놈으로 난것은 자랑이다” 1964·三中堂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102쪽), 민중인 것을 역설하고, 드디어 `씨알'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부른다. 함석헌에게 있어 씨알이란 민중의 고유명사로 이해된다. 이제 민중에게 민중 자신만의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석헌이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의 몸으로 상놈, 민중, 씨알을 살았다는데 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함석헌을 대할 때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는 그의 나이 네 다섯살 나던 해에 이미 “혼의 아구트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한 어린 때의 기억을 이렇게 말하다.
“내 가장 어린 때의 기억으로 너댓살 되던 때 밤에 할머니 품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아니오는 때가 있었다. 그러면 깜깜한 가운데 천정에 여러가지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꽃도 같고, 불길도 같고, 물결도 같고, 무슨 짐승도 같고, 수많은 눈도 같고, 가지가지 형상이 번차례로 나타난다. 굉장히 넓은 세계가 있고 그것이 일시에 흘러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새 세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모양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무서움도 아닌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붙어 있다.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자다가 이따금 공연히 깨서 말로 할 수 없는 짜증이 나던 일이다. 까닭모를 짜증이었다. 무엇이 분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고, 안타까운 듯도 하고, 내 살을 스스로 꼬집고도 싶었고 그래 자연 손발을 비비꼬며 울었다. 그러면 물론 어른들은 왜 그러냐고 책망한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 몰라주던 맘은 답답하였다. 어디서 오는 것임을 그때는 물론 지금도 모른다. 그러나 무슨 막연한 생각에 그때 무엇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 그 맘을 좀더 알아서 풀어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내 혼은 혹시 더 크게 자랐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린애들이 까닭을 알 수 없이 우는 것을 보면 나 자신같은 생각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한 위대한 혼의 아구가 트려고 그러는지도 모른다. 무슨 악마적인 것과 씨름을 하느라고 그러는지도 모른다”고.
참을 찾기 위한 싸움의 여정엔 강약기(强弱期)가 있고, 심지어는 변질·반역의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함석헌은 참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있어 불변의 인생을 살아냈다. 그의 90년 생애, 참의 싸움 특히 상놈·민중·씨알을 역사의 중심 주체로 받혀내는 일에 그는 가히 신의 경지를 살았다.
그의 유년·소년·청소년·청년·장년·노년이 고스란히 그 위대한 싸움에 드려졌다. 몸 전체로 상놈·민중·씨알을 살아낸 것이다.
민중의 체화(體化) 함석헌!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