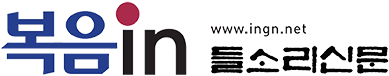유일신앙(唯一神仰) “참”, 그리고 그의 “참의 실험”

1965년 7월 삭발단식을 마치고 다시 민중 앞에 선 함석헌 선생.
함석헌에겐 누가 가르쳐준 것도,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절대의 신앙(?)이 있었다. 그것을 필자는 `함석헌의 유일신앙(唯一神仰)'이라 했다.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다. `참'은 실로 함석헌의 `모든 것'이었다.
'참'
참 찾아 예는 길에 한 참 두 참 쉬지 마라
참참이 참아가서 영원한 참 갈 것이니
참든 맘 참 참을 보면 가득 참을 얻으리
(함석헌의 시집 `수평선 너머' 전집 6.207)
참 향기람 한번 맘껏 들어 마시고 그 곳에 녹아버릴테야.
참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듣고 죽어도 좋지 않어?
참 맘이 있다면 한번만 만나고 영 없어져도 좋지 않어?
참, 참, 글쎄 참이 참 있다면 그래도 좋지 않은가? 그래야 하지 않나?
(함석헌 저 `편지' p.173, 174 일심사판 1957)
함석헌이 세상에 오면서 받아가지고 나온 오직 하나 `참'이라는 것, 함석헌은 거기에 목을 맸다. 그 하나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사람 노릇이었다. 함석헌에게 있어서의 참, 그것은 간디로부터 배운 것도, 우찌무라로부터 배운 것도, 다석 유영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었다.
태중에서부터 받은 것이었다. 역사는 상놈들, 민중들, 씨알들을 그 역사의 복판으로 안내할 첫사람으로 그를 택하면서 그 안내자가 지녀야할 원소(元素)로 곧 그 `참'(Truth, The true)을 부여한 것이다. 역사의 완성은 백년이 가고 천년을 가도 씨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씨알의 바탕이 참인지라 함석헌은 그 참을 그 유일신앙으로 받아 품고 온 것이다. 함석헌이 90평생을 울면서 산 것, 울면서 부르짖은 것, 같이 울기를 간원(懇願)한 것이 바로 `참'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 속에 꺼지지 않는, 꺼질 수 없는 그 `참'의 숨 때문이었다. 그것은 태산을 밀어내는 물길! 험산을 통째로 태우는 불길이었다. 함석헌을 우러르면서 말하는 학자들, 시민운동가들은 물론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함석헌' 할 때 그의 비폭력주의를 말하고 평화사상을 말하면서 그 사상, 그 주의의 연원(淵源)으로 간디를 든다. 함석헌의 그 사상, 주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 간디였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상가의 사상, 어떤 철학자의 철학도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독(獨) 창(創)일 수는 없다. 태초로부터 있어온 생물, 무생물, 의식들, 무의식들이 여며지고 짜여지고 걸러져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어떤 철학으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말이다.
함석헌 식대로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예외 없이 씨알을 모판으로 해서 길러져온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말한다면 독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함석헌 자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라면서 언급하는 간디를 비롯한 괴테, 톨스토이, 내촌, 샤르뎅, 칼라일, 헉슬리 특히, H.G 웰스 같은 인물들의 사상과 이상, 종교관들이 종교인으로서 함석헌, 사상가로서 함석헌, 정치평론가로서 함석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크게 혹은 작게 기여(寄與)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신앙인 참'의 씨는 분명히 함석헌의 독자적인, 독창적인 것이었다. 함석헌이 평생을 두고 사모했던 이가 간디였고 그리고 그의 `꿈의 삶터'였던 천안과 고성의 `씨알농장'들도 간디의 아쉬람에 근거한 것이었다.
(I have been an admirer of Gandhi for a long time, having read his Young India while still at Osan School. However after his death in 1948 I became a more ardent follower, reading more of his books and even forming a small study group. Eventually some friends suggested establishing a community similar to Gandhi's "Ashram", and as land was made readily available in 1957 we decided to establish a farm in the small town of Ch'onan, about thirty miles south of Seoul, where we could live together with selected young persons)(`KICKED BY GOD' SOK HON HAM, The Translation by DAVID E. ROSS)
“함석헌이 오산학교에 봉직해 있던 10년 동안 간디의 〈청년인도〉를 구독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간디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1948년 간디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더욱 열렬히 따르게 되었고 더욱 그의 저서들을 읽어 간디연구모임을 만들게까지 되었으며, 드디어는 간디의 아쉬람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몇몇 동지들의 요청이 있던 터에 서울에서 약 30마일 쯤 거리인 조그마한 읍마을 천안에 쉽게 그런 유익한 땅을 준비할 수 있어 한 농장을 이루면서 뜻을 같이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함석헌 자신의 글이나 또 그 글을 영역하여 발표한 데이비드 로스의 글은 간디의 인생과 사상이 함석헌에게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 `참'이라는 주제만은 그 연원이 달랐다. 그것은 `천부(天賦)의 특허' 같은 것이었다. 함석헌의 자료에 의하면 함석헌이 간디를 만난 것이나 흔히 한국의 동양사상을 말하는 일부의 학자들이 함석헌의 스승이었다고 말하는 유영모 역시 함석헌이 오산학교에 편입한 21세 이후의 일이다.
함석헌, '참'의 순례에 나서다
그는 너댓살 되던 해부터 `참'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 함석헌이 혼의 치솟음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너댓살 되던 해부터이다. 아이 함석헌은 깊은 밤 잠깨어 일어나 온몸을 비꼬며 우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갑자기 날빛같은 광명이 오는가 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겹쳐오는 것이었다. 그 어둠 깜깜함 속에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꽃도 같고, 불길도 같고, 물결도 같고, 무슨 짐승도 같고 수많은 눈도 같고 가지가지의 형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굉장히 넓은 세계가 있고, 그것이 일시에 훌쩍 가버리고 그 속에서 새(新)와, 새세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모양을 지금도(1963) 기억할 수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무서움 아닌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붙어있다. 잊을 수 없었다”(전집 4 p.178).
함석헌은 그의 나이 너댓이 되던 해부터 참, 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공연히 나는 짜증이었는데 자신도 어쩔수 없는 짜증으로 `무엇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에서였다고 했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내는 짜증이었는데, 어른들은 왜 그러냐면서 책망하고 눌렀다는 것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 `몰라주던 맘'은 답답했다고 가슴을 열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 그 맘을 좀더 알아서 풀어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내 혼은 혹시 좀더 크게 자랐을지도 모른다. … 한 위대한 혼의 아구가 트려고 그랬는지 모른다. 무슨 악마적인 것과 씨름을 하노라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열 살이 채 되기 전 일이었다. 가을철 늦게 외밭에 있는 외 하나를 보아두고 “인제 익으면 따먹어야지” 했는데 누이동생이 어느날 먼저 따먹어버려 누이동생을 붙들고 소리를 쳤다. “내가 익으면 따먹으려고 보아두고 왔는데 네가 따먹었단 말이야?”하고 시비를 걸었다. 때마침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던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시비인가 물으시고 그 내용을 아시곤 조용히 아들 석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얘, 그건 사람 아니냐? 입이야 마찬가지지.” 함석헌은 후에 “그 말은 그만 내 가슴에 칼처럼 찔렸다”고 말했다. 그때 함석헌의 나이 여덟, 아홉쯤이었을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세상모를 어린아이가 주변이 다 그렇듯이 아들이 (더군다나 외아들은) 우선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때, 어쩌면 어머니의 그 말이 칼처럼 아이 석헌의 가슴에 꽂혔을까? 석헌은 참의 순례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어떤 거짓도 아이 속에 있지 못하도록 씻어내자 하시는 하늘의 뜻을 따라서였다. 모든 거짓을 다 제하여 `참'만 남도록, 참만으로만 있도록. 참으로만 살도록, 죽는 것도 참으로 하도록 지켜 키우자 함에서였다. 열 살 안된 아이 가슴에 아들, 딸의 유별이 없어지는 기이한 체험이 왔다니!
학순 아저씨네는 가난뿐이었다. 그 아들로 나이는 석헌보다 서너살 아래, 학교에서는 한 해 아래인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며 가르치시던 선생님 한 분이 학교를 떠나게 되어 학생들이 여럿이서 선생님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침도 변변히 못 먹고 학교에 왔다가 걸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아이를 그 아이의 집 앞까지 엎어 온 아이가 석헌이었다. 함께 했던 동무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뒤처진 아이를 석헌은 버리고 갈 수가 없었다. 그것은 `참'이 내린 명(命) 때문이었다. 함석헌의 참은 고도의 논리가 아니었다. 뒤처진 것을 뒤처진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그것은 참의 순례요, 후에 함석헌이 즐겨 쓴 `참의 실험'이었다.
`참'은 함석헌의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이면서 동시에 `실험의 대상'이었다. 참이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이라 할 때 그것은 `절대'요. `영원'이며, 실험의 대상이라 할 때 그것은 끊임없는 성육, 육화를 뜻한다. 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참'의 명을 받는 함석헌은 동시에 끊임없이 명으로 받은 그 `참'을 실험했다. 함석헌은 일생을 그 `참의 실험'으로 살았다. 중학교에 못 가게 되는 한반의 동무가 있었다. 공부를 꽤 잘했다. 석헌이 중학교에 간다는데 저도 가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일언지하에 “얘 이놈아, 시장에 쌀 사자는 놈은 있어도 글 사자는 놈 없더라”면서 물리쳐 버렸다. 그 동무는 아버지 따라 영 농사꾼이 되어갔고, 석헌은 읍에 있는 중학(양시공립보통학교)에 갔다. “나는 무슨 죄나 지은 듯 미안해 무슨 말을 해줘야 할 듯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때의 그 슬픈 기분이 지금도 생각만 하면 끓는 솥뚜껑을 열면 훅하고 김 치달아 오르듯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다. 학교엘 갔다가 방학이 되어 돌아오면 그 얼굴과 손이 점점 시커먼 농사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손을 좀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고 천연히 서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혹 뽐낸다할 듯해서 두렵던 생각, 될수록 공부나 내가 가있는 도회지의 얘기는 피하려 했던 생각이 지금도 어있다”(전집 4. p.55).
함석헌의 생애엔 경쟁이란 없었다. 뒤처진 이웃들의 그 뒤처진 것이 늘 자신의 탓으로만 느껴졌고 그런 이웃, 그런 동무들이 주변에 있는 한 그 역시 뒤처진 자로 있어야 했다. 하늘이 특별히 골라준 `참맘'이 신비에 가깝다 하리만큼 그를 이끌고 있어서였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