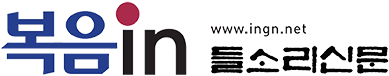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바푸(Bapu=father) 함석헌의 삶]

퀘이커 서울모임 회원들과 함께(1970년 초).
하나가 된 두 바보
가히 최진삼의 결혼식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것이었다. 연회(宴會)를 뺀 식순에 의해 걸린 시간만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장 다섯시간 동안 계속 되었으니.
한다하는 이들의 주례사, 축사, 격려사들이 쏟아졌지만, 그날 1948년 10월 26일 이후 함석헌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하직한 1989년 2월 4일까지 최진삼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함석헌이 전해준 것이었다.
'잽새'의 이야기에 또 하나 최진삼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다. 역시 한 예화를 들어 최진삼의 '사람됨'을 칭찬하자는 것이었는데, 함석헌의 그 이야기에서만의 최진삼은 영낙없는 바보로 이해된다.
함석헌의 최진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옛날 서당공부 시절에 한 서당에 있었던 '어떤 서생의 방귀이야기'. 공부시간에 한놈이 방귀를 뀌었다. 뿡… 하는 방귀소리에 모든 서생들이 웃음보를 터트렸다. 그러나 선생의 표정은 여느때와 달랐다.
곧 '웬놈이냐?'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방귀 낀 놈이 바로 옆자리 서생의 잔등을 치면서, “야, 이놈아. 방귀를 뀔려면 밖에 나가 뀌어야지. 무슨 짓이야” 하며 쏘아보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그놈은 교활한 놈, 음험한 놈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놀랍다 해야 할까, 기이하다 해야 할까? 그 무안을 당한 서생놈은 도무지 말이 없더라는 것이다. 억울하고 분하기가 이를데 없으련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도 묵묵을 견뎌내는 사내놈, 함석헌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그 바보가 바로 최진삼이다” 했다.
조금 전에는 최진삼을 새중의 왕으로 뽑힌 잽새에 비유하더니, 이제는 천하에 더없을 바보에 비유하는 것이었다. 함석헌이 최진삼을 그렇듯 귀한 인격으로 여긴 것은 최진삼이 청소년기를 거쳐 스물여섯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몸 하나로 자신을 섬겨준데 대한 고마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석헌이 최진삼을 만난 이후 10여 년간 시종여일한 최진삼의 '바보스러움' 때문이었다. 특히 50년대 후반부터 함석헌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주변에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 운동가들이 그칠줄을 몰랐지만 최진삼은 여전히 '바보'로 함석헌 곁을 살았다.
함석헌이 그의 평생 동안 최진삼을 못잊어 한것은 바로 그 최진삼의 변함없는 바보스러움 때문이었다. 함석헌은 어느날 그가 사랑하는 한 제자와 함께 원효로4가 그의 자택에 꾸려진 그의 개인지(誌)인 '씨알의소리' 사무실에 앉아 씨알의소리 운영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었다.
씨알의소리 사무실 출입구가 함석헌의 자택 앞마당을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최진삼은 검정 작업복 바지에 런닝셔츠 차림으로 열심히 마당청소를 하고 있었다. 최진삼을 본 함석헌이, “좀 쉬고 저녁때쯤 하지. 너무 덥지 않아”, “아니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것 말고 뭘 할것 있나요?” 하고는 이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듯 하던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었다. 최진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함석헌은 혼잣말처럼 “저 사람은 그저 날 닮아서…”하더라는 것이다.
함석헌이 사랑한 그 제자는 이 일이 있은 이후 최진삼을 함석헌의 첫(?)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함석헌이 최진삼을 얼마나 가슴깊이 품고 있었는가는 “저 사람은 그저 날 닮아서…”라는 말로도 가늠할 수 있다 하겠지만,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함석헌이 일찍 그의 셋째딸 은자를 그와 짝지어주면서, '바보 최진삼'이라 했었는데 오랜후에 자기 자신의 호(號)를 '바보새'라 불렀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함석헌도 최진삼도 바보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함석헌은 그가 찾는 '사람'의 모습을 최진삼에게 보았고, 최진삼은 '그 사람'을 함석헌에게서 본 것이다. 그래서 둘은 하나같이 바보로 함께 살았다.
지식이라는 죄(罪)
1년을 갇혀 산 평양 대동경찰서 유치장, 함석헌은 1년 여의 옥살이를 끝내고 다시 용암포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다. 2만여 평이나 되는 땅이 있어 확실한 농삿꾼이 될수만 있다면 먹고사는 것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글 읽고, 글 쓰고, 글로 밥을 먹고 살아온 함석헌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했지만 달리 길이 없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큰 살림을 이끌어주시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리셨고, 살림은 빚더미에 쌓여있었다. 일꾼들은 모두 집을 떠나버렸고, 아버지의 땅은 묵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최진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석헌의 가문을 지키고 있어 더 고마울수가 없었다.
이제는 철저한 농사꾼이 되어야 겠다 결심을 했지만 결심을 하고 나니 새롭게 다가오는 깨달음이 글 말고는 자신이 '판무식쟁이'라는 사실이었다. 농사일이야말로 '두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함석헌 주위 사람들은 공사간에 그와 함께 하려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일경의 감시를 당하는지라 마을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나쁜 의미에서는 아니었다해도 그의 지극한 글 공부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지…”하게 했다.
다시 다음해 성서조선(聖書朝鮮)사건으로 한 해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후엔 농사 마저도 두려워져 갔다. 사방길이 다 막힌 이제 할 것이 있다면 농사뿐인데 그 농사가 두려워진다니….
후에 함석헌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이제 성서조선 사건까지 치르고나선 정말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 아주 농사꾼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농사꾼으로 자처하고 농사꾼의 벗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농사꾼들은 나를 벗으로 알아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식의 죄'가 그렇게 큰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말만 아니라 서로 품앗이가 돼야 농사꾼의 친구겠는데 책상물림과 누가 품앗이를 하겠습니까? 또 말 조차도 동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 사방이 다 막혀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길을 그렇듯 전혀 빠져 나갈수 없도록 철못질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하나님은 함석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생각은 접으셨기 때문에 함석헌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함석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죽어주는 것이었다. 죽고, 죽고, 또 죽고.
함석헌에 있어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었다. 함석헌 스스로가 번제(燔祭)가 되고, 관제(灌祭)가 되는 것이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정화에 유일의 요소가 시종간(始終間)의 '희생'이었으니까.
출옥 이후 아직도 완전히라고 할수는 없었지만 함석헌 자신도 이같은 예정(?)된 '신탁(神託)의 생(生)'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그가 평양 대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출옥하자 마자 성서조선지우(聖書朝鮮誌友)들에게 출감소식을 전한다.
“지난날 제가 잠깐 괴로움을 당하였을때에는 많은 염려와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 못하오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인줄 알아 기뻐합니다. 악(惡)은 점점 더 유혹과 위협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사욕이 없는 시간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생명은 건전하고, 건강한 생명은 평화를 누립니다…(중략).
이 갈대토막 같은 것을 가지고 주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말씀을 노래하자는 것인데 속을 깨끗이 비게 하였던들 그의 미묘한 음악이 나왔을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도무지 소리가 날 수 없었습니다.… 아해들이 이 갈대토막을 찔러불어보고, 던지고, 또 저것을 짤라보고 하는 모양으로 주는 행여 잘 뚫려 당신의 생명의 진동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갈대 제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있는줄 알아 염려함으로 항상 메였었습니다.
인간의 말이 다 되는 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점인 것을, 제 말을 해볼양으로 늘 고집했습니다. 회개합니다(이치석, 〈함석헌 평전〉 시대의 창, 2005년 11월 15일, 〈성서조선〉 1941년 7월호).”
함석헌 연구가 이치석은 그의 함석헌 평전에서 위의 성서조선 지우(誌友)들에게 보내는 글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대동경찰서에서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장년에 들어선 마음 속에는 혹시 '사상의 외로운 길손'으로 거듭나는 내면의 진화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쓰고 있다.
“인간의 말이 다 되는 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점인 것을, 제 말을 해 볼양으로 늘 고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 것은 분명히 이치석이 이해한 그대로였다.
아무튼 함석헌은 자신의 말을 끝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한다(What to do)며 버티어온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었으니 이제야말로 함석헌은 철저히 감추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거의 완전하리 만큼 사장(死葬)되어야 하는 함석헌!
그래도 농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잡풀덮인 밭을 다듬을 수 있는데로 다듬고, 농기구도 새롭게 베려오고, 좋은 종자들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움직였다. 일순을 영원으로 사는 것, 그것은 함석헌의 불변의 인생관인지라 촌음의 시간의 허송, 허실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1940년, 41년을 거치는 그 수형의 수난 1년을 넘어 어쨌던 이제는 전신을 추스려 새해를 대비해야 한다. 함석헌은 그렇게 1942년 새해를 맞는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맞은 새해였다.
농사하는 일이야 어느 놈이 막겠는가! 그런데, 아니었다. 이미 죽어서 살기로 예정(?)된 그에겐 농사도 안될 일이었다.
“죽기로 결정된 놈이 농사라니?….” 하나님은 그에게 농사짓는 일까지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긴 일이 성서조선의 필화사건이었다. 소위 김교신의 〈조와(吊蛙)〉라는 이름의 필화사건이 그것이었다.
“세상일 끝낸 주제에 더이상 세상일 관심하지 말라”시며 “오직 내가 명하는 것으로 네 일을 삼으라”는 듯 김교신의 조와는 다시 함석헌을 오랏줄로 묶어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끌고 갔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