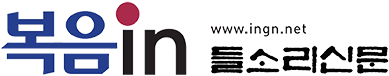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들소리> 43년, 말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 >1<
“약속이란 목숨을 거는 것이다. 1960년 11월 18일 밤의 약속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만 있는 1977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던 그날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 무조건,”

서른다섯 살 되던 해 집에서 덥고 잘 이불과 라면 끓일 냄비를 들고 4평짜리 3층 사무실로 이사했다. 첫날밤은 바닥에 신문지 몇 장을 깔고 사무실 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집 나온 첫 밤은 금식이었다. 은혜의 밤 평안의 아침을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다.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집에서 나올 때 큰딸이 일곱 살, 아들이 다섯 살, 막내딸이 세 살. 나는 아내에게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아이들 학비(등록금)는 내가 책임질 터이니 먹이고 입히는 일은 당신이 맡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내의 답을 듣는 둥 마는 둥, 보따리 둘러메고 집을 나서면서 나는 혼자 말인 양, 그러나 아내에게 다짐한다는 뜻으로 6, 7년쯤이면 승부가 나겠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한 말, 6~7년이 아내의 귀에는 그 기간 쯤 방황하겠다고 들렸을 수도 있고, 6~7년이면 살림을 합칠 수 있다고 들렸을까, 그러나 그해 1976년 12월 집 나서면서 내가 예상한 6, 7년은 그때쯤은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6, 7년이 아니고 43년이 지난 2019년 6월 10일인 오늘도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가족을 다시 만나서 처자식과 함께 단 하룻밤을 지내지 못한 이 하늘 아래서 참으로 못난 인간이 되어 있다. <들소리> 간판 내걸고 43년인데 하고 싶은 말 아직 다 하지 못했고, 7년 정도 싸우다가 전사하자 했으나 비겁하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다.
사냥꾼의 총에 설맞은 멧돼지처럼 절뚝거리면서 피를 흘리고 뛰고 달리기는 하지만 나와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려는 사탄의 집단과 싸움을 하는 것인지 도망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의 나그네 인생은 처자식 내던지고 집을 떠난 1976년 12월이지만 보다 먼저는 1957년 4월 3일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부모형제를 떠난 때부터다. 그때는 부모님은커녕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 외입이고 근사한 표현으로는 ‘무단가출’이었다. 학업과 구도(求道)의 쌍지팡이를 얻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1960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였고 한 달 전인 11월 18일 밤에 메시아 예수를 만났고 그분과 종신계약을 맺었다.
언약(에팡겔리아, επαγγελια)이고 약속이었다. 이 단어 하나에 내 목숨을 담보했다. 1960년 11월 18일 밤 예수님은 ‘나는 네 안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숨을 쉰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너는 내 심장, 내 심장 복판에 있다는 말로 들었다. 그리고 그해가 가기 전에 <그루터기>(사 6:13)와 <들소리>(사 11:6~8)를 복음의 도구로 준비했다. 하나는 주간, 또 하나는 월간으로 발행하면서 복음활동을 광폭으로 넓히고자 했다.
나는 지금 멋진 표현으로는 내 인생록의 대강을 말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는 유서 쓰는 정직함이라고 내 자신을 달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 나이 78살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쯤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덤으로 주신 날들일 터이고 은총이라면 ‘연장전’을 주신다는 날들일 터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선다.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인생을 몇 구비로 나눌 수 있다. 부모 슬하에서 살았던 15년, 그리고 1957년 4월 3일에서 1960년 12월까지 학업과 주 예수에게 붙잡힌 날까지를 먼저 말할 수 있다. 특히 1957년에서 1960년 말까지 4년은 참혹하고 죽음보다 무서운 날들이었기에 어떤 형식의 글로 할까? 차마 산문으로 처리하기에는 벅차니까 성장소설 형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1960년 말부터 1976년까지는 대충 이미 발표했다. 이 내용은 1980년인가부터 만 2년동안 102회 당시 <크리스챤신문>에 연재했다.
오늘 시작한 기간은 1977년 1월부터 1988년 말까지 <그루터기>와 <들소리>로 발행한 기간 10여 년 부분을 본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 기간의 내용 제목을 ‘나의 신앙 나의 예수’로 잡았다.
내가 열다섯 살 어린 나이이기는 했으나 우리가 살아온 그때는 일찍 철이 들던 때였다. 나는 1942년생이지만 일제 순사들이 우리 집 장독대를 쑤시고 다니면서 공출 독촉을 할 때면 어린 가슴이 쿵탁거리던 날의 경험이 있고, 6.25 동족 전쟁이 터지고, 어제까지 공부했던 학교 내 책상이 있던 교실이 다음날 등교하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초등학교 나머지 3년을 단 하루도 교실에서 공부를 못했다. 이 산 저 들판 눈비 오는 날은 마을 공회당을 옮겨 다니며 공부했었다. 특히 산비탈에서 공부할 때 B-29 공습이 수시로 있었던 전쟁 3년 동안을 교실도 없이 공부했다. B-29 저공비행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논두렁 밭두렁 사이로 기어들던 그 험악한 날들이었다. 그래서 빨리 배우고 성장하여 쓸 만한 재목이 되겠다고 나는 15살에 가출했다.
15살 가출이야 얼핏 무용담록에 집어넣을 수 있으나 35살 어린 자식 셋에 마누라까지 내던지고 또 한 번의 출가, 이제는 불가(佛家)의 표현으로는 출가사문(出家沙門)행이다.
1. 16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 “약속”
약속이란 목숨을 거는 것이다. 1960년 11월 18일 밤의 약속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만 있는 1977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던 그날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 무조건, 대책이 없지만 일단 떠나는 행동부터가 대책이라고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내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루터기>와 <들소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더 미적거리면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주섬주섬 이불 보따리 싸 짊어지고 집을 나선 것이다. 1977년부터 1980년 무렵까지는 더 많은 고생을 했다. 한마디로 크게 고생을 했다. 가끔 내가 하는 말로 ‘100일 동안 (삼양)라면만 먹기였다.’ 80년 5월부터였던가? 100일 동안 단 한 끼도 밥톨을 입에 넣어보지 못했었다. 긴 여름동안 그때 라면이 하나에 20원씩일 때였나, 매 끼니마다 한 개씩을 구멍가게로 사러갔었다. 20원짜리니까 열 개를 살 수는 있었으나 다음 끼니는 라면을 먹지 않게 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예수께 드리는 절차였으며, 예수를 향한 항변(저항)이기도 했었다. 다음 끼니는 라면을 먹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한 개씩만 사왔었다.
구멍가게 할머니에게 20원을 놓고 라면을 쥐고 나오면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워마, 어쩐대냐 저렇게 잘 생긴 청년이 한여름 내내 라면을 먹나…” 한다. 할머니의 말씀을 등뒤에 남기고 사무실 곤로에 라면을 삶는다. 10일, 20일 계속해서 3개월 째 되니까 구역질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라면 조리법이 발전했다. 일단 삶은 라면을 수돗물에 행궈냈다. 목이 부러진 선풍기. 상표가 드레스였던 기억이 난다. 선풍기 바람에 삶았다가 찬물로 씻어낸 라면발이 고들고들해진다. 그걸 목구멍에 손가락으로 쑤셔 넣고 다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시장기가 사라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식이다. 처자식 내버리고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 바닥에서 숙식을 하면서 나는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마지막 거지가 되게 하소서.”
1988년도 말까지 10여 년 간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아도 괜찮은 기억들이 몇 있다. 괜찮은 고생 이야기, 예수와의 사랑 이야기. <들소리신문> 독자들이 아마 조효근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를 이야기도 더러 나올수 있다.
2. <들소리>시대 이후는?
1989년 2월부턴가 <들소리신문>과 <들소리>는 <예수의 빛 들소리> 이름으로 별도 형식으로 발행했다. <예수의 빛 들소리>는 4×6배판, <들소리신문>은 지금의 대판형으로 초기부터 발행했다.
그런데 <들소리신문>을 발행하면서 <들소리>만의 고유한 순수를 잃어버렸다. 1497년 포르투칼의 바스코다마가는 대서양을 건너 희망봉 주변에서 길을 잃었고, 또 무슬림들의 방해에 휘둘리다가 또 어느 무슬림인지 천사인지 모를 위인을 만나 인도양을 건너 인도의 켈리컷 항에 도착하여 대서양과 인도양을 종단하고 대양시대를 활짝 열었다는데 나는 <들소리신문>을 발행한 이후 항로를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들소리신문>을 발행한 198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0여 년은 신문 등 구체적인 자료도 있고, 특히 1992년부터는 운영이사회 활동 자료도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3. 세 아이들의 눈동자
졸지에 고아, 과부, 홀아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밤마다 내 눈 앞에서 벵글벵글 도는 여섯 개의 눈동자들. 세 놈의 자식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이를 악물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러다가 어금니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잠을 설치는 밤들이 많았다.
어떤 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와 세 아이들의 사는 집 창가로 간다. 땅거미 진 초저녁, 창가에 비치는 아이들 그림자,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내의 독살스러운 말소리. 뭐야! 저게 스트레스이가? 내가 내게 쏟아 붓는 분풀이를 아이들이 뒤집어썼을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들과 섞일 무렵이면 나는 개봉동에서 북아현동(굴레방다리)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침통해진다. 이따위 자세로 며칠을 더 버틸 것이며, 무슨 일, 뭐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 잘못나간 기독교의 틀을 바로 잡는다고…. 자탄과 서글픔에 또 한밤을 지새우기도 많이 했었다.
4.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누구나, 때가 되면 한 권 써보고 싶은 회고록(인생록) 남기자는 뜻 전혀 아니다. “내 들소리 인생” 지금까지는 실패했음을 고발하려는 고발장 쓰기다. 그러나 단순한 패배주의적 변명이 아니다. 굳이 밝힌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선교인생 60년(1960년 11월~2019년 5월)을 불질러 버리려는 도발이고 열망이다. 도무지 견딜 수 없다. 혹시 오늘 이 글을 쓰는 이후의 나머지 은총의 시간을 기다리는 눈물겨운 소원도 담아서 앞으로 쓰고 싶을 때마다 더 쓰는 “나의 신앙 나의 예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알림]
소설 <징기스칸 제국> 5회부터는 계간 <들소리문학>에서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16면 증면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발행인이 과다 지면을 사용하는 일, 또 소설 연재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득이 결단을 내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