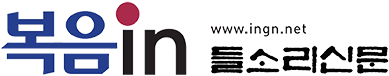40여 년 환우들과 동고동락하며 깊은 사랑 전한 두 간호사의 삶

마가렛>
성기영 지음/예담
한센병 환자들이 머무는, 천형의 땅으로 불린 소록도에서 환우들에게 부지런한 섬김과 따뜻한 위로로 삶의 의지가 돋아날 수 있게 도왔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한 통의 편지만 남긴 채, 40여 년 전 이 땅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가방 하나씩만 메고 소록도를 떠났다. 2005년 11월 22일, 젊었던 두 명의 간호사가 ‘큰 할매, 작은 할매’ 되어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마지막은 참 조용했다. 사랑은 크고 깊게, 삶은 단출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처럼….
이 책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소록도성당,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곁에서 함께했던 소록도 환우들의 증언을 등을 통해 기록된 것으로 두 간호사의 어린 시절과 소록도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담은 첫 기록물이다.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함께 그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전한다.
몸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한센병 환우들의 아픈 현실, 그들과 함께하며 치료의 손길로, 따뜻한 위로로, 또 위트 넘치는 말들로 좌절과 절망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삶을 걷게 안내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갖는 위대함을 보게 한다.
마가렛은 1959년 12월, 마리안느는 1962년 2월에 한국 땅을 찾았다. 그들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환우들을 돌봤다. 당시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때에 소록도는 치료보다는 격리의 의미가 컸고, 환우들 사이에서는 ‘죽으러 가는 길’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곳에서 환우들과 동고동락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에는 유난히 들고나는 우편물이 많았다. 가족들과의 안부도 있었지만 약과 치료제가 많이 필요한 소록도의 현실을 고향에 알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편지들이 수시로 오갔다.
책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부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환우들을 대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 입, 마리안느를 위해서 한 입,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입. 그렇게 딱 세 입만 먹어봐요.”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아 한센병에 걸린 한 청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죽을 궁리만 하던 그가 심각한 상태로 입원했다. 독한 한센병 치료약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그에게 마가렛은 직접 사과젤리를 만들어 한 숟가락씩 입에 떠 넣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았다. 그의 대소변도 직접 받아냈다. 인내의 투병생활 끝에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절망의 순간, 신은 바로 자신의 곁에서 매순간 함께 했음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결혼은 했어요? 결혼 못했죠? 언제 결혼해요?”
환우들이 두 간호사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질 때면 마가렛은 킥킥, 마리안느는 근엄한 표정. 그녀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결혼 벌써 했어요. 환자들하고.” 그러면서 약 후유증으로 온몸의 피부가 새까맣게 변한 환우의 팔짱을 끼며 “나 결혼했어, 이분이랑!”하는 마가렛의 농담은 모두를 웃게 했다.
종교적 신념, 가슴이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묵묵히 따르는 가치관, 사랑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숭고한 믿음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움직였고, 소록도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힘인 것을 책은 드러내고 있다. 서로의 삶과 마음이 포개져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함께 나눈 소록도 사람들과의 감동 이야기가 펼쳐진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